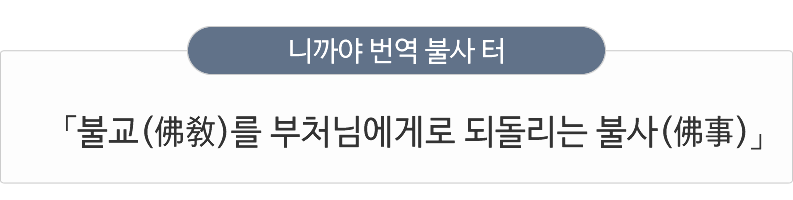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지도법사 겸 선원장 비구 뿐냐디빠[bhikkhu puññadīpa – 해피스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인류 역사에 실제(實際) 하셨던 스승입니다. 우리와 같은 중생으로 오셔서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 수반되는 괴로움[고(苦)]의 문제를 고민한 끝에 불완전을 초래하는 조건들의 해소를 통해 고멸(苦滅) 즉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치의 형이상학도 포함하지 않은 내 삶의 이야기 즉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고(苦)를 설명하고, 그 생겨남의 조건관계를 설명합니다[고집(苦集)]. 조건관계의 해소를 통해 생겨나는 행복[락(樂)]을 설명하고[고멸(苦滅)], 해소의 방법과 그 실천을 독려합니다[고멸도(苦滅道)].
부처님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덧칠을 했습니다. 불교가 부처님을 떠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분식(粉飾)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변화일 뿐입니다. 지금도 부처님에 의지해 삶을 향상하려는 사람들은 분식되지 않은 원래의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불교(佛敎)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佛事)」의 이유입니다.
이 불사(佛事)의 일환으로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은 근본경전 니까야의 번역불사를 시작합니다. 10년의 일정으로 시작하는 이 불사(佛事)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됩니다.
첫째, 공부의 기준입니다.
세월을 이유로 덧칠된 분식(粉飾)은 바르게 삶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디부터가 덧칠이고 어디까지는 덧칠 이전인지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은 공부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를 타당성 있게 선택하는 것인데 교리적 충돌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어떠한 주제이던 이 공부의 범주에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율장(律藏)[vinaya] ㅡ 마하위방가[비구 227 계(戒)]-비구니위방가[비구니 311 계(戒)]
• 경장(經藏))[nikāya]
ㅡ ① 디가 니까야, 맛지마 니까야, 상윳따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
② 쿳다까 니까야 일부[숫따니빠따, 법구경]
둘째, 부처님의 의도를 십분 반영한 번역입니다.
세월을 이유로 덧칠된 분식(粉飾)은 삶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밖의 교재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 삶의 이야기 즉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괴로운 현실의 조건관계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또한 그 조건관계의 해소를 바르게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 안에서 공부는 부처님의 설명 즉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신 의도를 충분히 드러내 줍니다. 삶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십이연기(十二緣起)[고집(苦集)]이고, 수행지도(修行地圖) 위에서 설명하는 팔정도(八正道)[고멸도(苦滅道)]입니다.
번역은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언어적 능력과 작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전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알리어에 대한 언어적 능력과 부처님의 의도에 대한 깊은 공감입니다.
이때, 이 불사(佛事)의 터는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지도(修行地圖)라는 도구를 십분 활용해 부처님의 의도를 공감하는 위에서 빠알리어의 번역을 함으로써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 번역불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국내외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번역이 쿳다까 니까야-아비담마-아함경-주석서-청정도론 등 후대의 교재에 의존하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이런 번역은 세계불교에 초유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서 교리적 충돌 없이 부처님의 의도를 정확히 풀어내는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분들께서 관심과 성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解彼 & happy] 하십시오!
2018년 01월 20일
근본경전연구회(根本經典硏究會)-해피법당(解彼法堂) 지도법사 겸 선원장
비구 뿐냐디빠(bhikkhu puññadīpa) 해피 스님 합장(合掌)
 연구회
연구회
